Ⅰ. 서론
본 연구자는 다양한 정재 복원 공연에 참여 및 관람을 하면서, 연향이 거 행되던 장소, 의식에 활용되는 소품의 곳곳에서 ‘꽃’이 사용되는 것을 발견 하였다. 특히 진작과 함께 연행되었던 궁중 정재 작품 속에서 ‘꽃’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무용수가 꽃을 꺾거나 또는 꽃을 손에 쥐고 춤을 추는 등 꽃이 ‘무구(舞具)’로 사용되거나, <영지무>의 ‘영지반’이나 <가인전 목단>의 ‘목단화준’과 같이 꽃이 무대를 장식하는 ‘무대 장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악학궤범』과 『정재무도홀기』의 기록을 보면, 꽃이 무구나 무대 장치 외의 다양한 부분에서도 사용되거나 언급된다. 먼저 <육화대(六花隊)>, <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과 같이 ‘꽃’이 제목 자체에 언급되기도 한다. 다 음으로 춤사위 용어에 ‘꽃’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춘앵 전(春鶯囀)>의 ‘전화지(轉花持)’이다. ‘전화지’란 ‘바람에 날리는 꽃잎을 잡 는 듯’ 움직이는 춤사위를 일컫는다. 또한 <사선무>의 “좌우의 무용수가 흩 어져 ‘꽃’ 모양을 만들며 춤춘다(左右挾 散作花舞)”와 같이 작품에서 ‘꽃’ 형 태의 구도가 사용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정재의 창사에도 ‘꽃’이 언급된다. 일례로 <육화대>에서는 ‘복 숭아꽃, 살구꽃, 매화꽃, 배꽃, 장미화, 산복숭아나무 꽃’ 등이 언급되는데, 이처럼 정확한 꽃의 종류가 언급되기도 하지만 <첩승무(疊勝舞)>의 “春光先 到百花樓(봄빛이 먼저 찾아와 온갖 꽃 핀 누각에서)”와 같이 ‘꽃’이 은유적 표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정조대 ~ 고종대의 『의궤』에 기록된 정재 44종1) 중, 43종에서 꽃이 등장한다. 이렇듯 ‘꽃’은 궁중 정재의 다양한 요소에 등장하고 있지만, 궁중 정재 속 ‘꽃’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미비하다. 그러나 단편적으 로 정재 속 꽃을 조명하는 연구는 있다. 김용미(2011)는 ‘궁중정재 가인전목 단의 이미지 화예조형 표현연구’에서 『정재무도홀기』와 『의궤』에 기록된 <가인전목단>을 분석하고, 작품에 등장하는 목단꽃의 의미를 파악하여 이를 활용한 전시를 기획하였다. 미술 분야의 연구임에도, 궁중 정재 속 꽃을 조명 하여 그 중요성을 입증하는 유의미한 연구이다.
다음으로 궁중 연향의 연출 과정을 연구하며 꽃에 대해 언급한 사례도 있다. 김혜자(2008)는 ‘朝鮮時代 宮中 宴享에 裝飾된 綵花에 관한 硏究’에서 의궤를 분석하여 조선시대 궁중 연향에 사용되었던 ‘채화’의 종류와 사용 목적을 분류하였다. 궁중 연향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꽃 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연구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의강(2005)은 『한국 전통무용의 변천과 전승』 중 ‘순조 무자년(1828) 연 경당 진작의 성격과 연출 정재들 간의 내적 흐름’에서 정재 ‘예제 악장’에 언급된 꽃을 정재 연출과 연관지어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처럼 궁중 정재에 등장하는 꽃은 여러 연구에서 파편적으로만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꽃은 정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하 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은 단순히 ‘꽃’의 외형적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것을 넘어서 각각의 꽃에 상징을 부여하 여 꽃을 통해 부귀, 사랑, 행복, 존경, 축복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였다(장진 희, 2009). 따라서 궁중 정재에 꽃이 활용된 목적 또한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상하는 것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넷 애드쉐드(Janet Adshead)의 『무용 분석의 이론 과 실제(Dance Analysis : Theory and practice)』에 제시된 무용 구성요소 분류 법을 토대로 궁중 정재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각 정재 종목에서 ‘꽃’이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였는지 알아볼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조선 정조 대 (1795)에서부터 고종 대(1902)까지 의궤에 수록된 정재 종목으로 한정하였다.
정재 속 ‘꽃’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정재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넷 애드쉐드가 제시한 무용의 구성 요소는 움직임(Movement), 무용수(Dancers), 시각적 무대 장치(Visual setting), 청각적 요소(Aural elements)이다. 위의 분류법을 토대로 궁중 정재를 나누었 을 때, 정재 춤사위와 대형은 ‘움직임’으로 무구 및 무대 장치 그리고 머리 장식 및 의상은 ‘시각적 무대 장치’로 창사와 음악은 ‘청각적 요소’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애드쉐드가 제시한 구성 요소만으로는 궁중 정재에 등장하는 모든 꽃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꽃은 작품과 음악의 제목에도, 춤사위 명칭에 도 언급된다. 또 더 나아가 춤이 연행되는 ‘무대’ 이외에도 궁중 연향이 거행 되는 장소의 곳곳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정재를 이해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드쉐드가 제시한 ‘무용의 구성 요소’ 이외의 부분 인 ‘작품 제목, 음악 제목, 춤사위 명칭, 공간’과 궁중정재의 핵심인 ‘창사’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정재 연구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을 꽃을 통해 조명하며 정재의 개념을 새롭게 환기하고자 한다. 이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자 필요성이다.
Ⅱ. 궁중 정재 속 꽃
1. 꽃을 통해 본 정재의 구성요소
우리 민족의 삶 곳곳에 스몄던 꽃은, 궁중 정재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한다. 궁중 정재는 歌·舞·樂·詩 그리고 소품 및 의상들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기에, 이러한 정재의 특징을 반영하여 정재의 세부 구성 요소를 나누 고, 그 후에 각각의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먼저 분석의 범위를 정조 대(1795)에서부터 고종 대(1902)까지의 의궤에 수록된 44종의 정재 종목으로 한정하였다. 다음으로 세부 분석을 위 해 자넷 애드쉐드(Janet Adshead)가 제시한 무용의 구성 요소를 참고하였다. 자넷 애드쉐드는 무용의 구성 요소를 움직임(Movement), 무용수(Dancers), 시각적 무대 장치(Visual setting), 청각적 요소(Aural elements)로 나누었다.
그러나 정재에서 ‘꽃’이 등장하는 방식을 파악하다 보니, 애드쉐드가 제시 한 ‘무용의 구성 요소’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꽃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였 다. 먼저 꽃이 정재 작품과 음악의 제목 그리고 춤사위의 명칭에서 언급되는 경우이다. 일례로, 조선 후기의 향악정재 <가인전목단>은 작품의 제목대로 ‘아름다운 사람이 목단을 꺾는다’라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연행 시 모란꽃과 목단화준이 소품으로 사용되며, 춤사위와 창사에서도 꽃을 꺾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목을 통해 작품의 중심 소재 및 전개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재의 제목은 작품을 파악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는 음악과, 춤사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음악은 ‘청각적 요소 (Aural elements)’로 분류되었다. 자넷 애드쉐드는 역사적으로 움직임의 형식 이 음악의 구성이나 리듬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움직임’과 ‘음악’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각적 요소에 속한 ‘음악’은 음악의 형식적 구조 즉, 리듬이나 템포 그리고 멜로디에 대한 언급이 지배적이며, 음악의 구조와 움직임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가 주요 분석 내용이다.
그러나 궁중 정재에서 음악은 작품의 연출을 다양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는 음악의 ‘제목’을 분석하면 알 수 있는데, 같은 작품에서 사용되는 음악이라도, 작품의 연행 시기나 목적 그리고 작품의 내용에 따라 그 제목이 변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제목을 해석했을 때, 작품의 연행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제목에 ‘꽃’이 언급될 경우, 작품의 내용이 꽃과 관련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의 구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음악의 제목 역시 독립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에도 꽃이 등장한다. 이때 공간은 자넷 애드쉐드가 제시 한 공간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시각적 무대 장치에 언급되는 ‘공간’은 무용 수가 움직임을 연행하는 ‘무대’만을 한정한다. 그러나 꽃은 무대뿐만 아니라 작품이 연행되는 장소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렇기에 공간에 대한 분석은 무 구 및 무대 장치 연구와는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궁중 정재는 歌·舞·樂·詩 그리고 의상 및 소품들까지 모두 유기적 으로 연결된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만 작 품의 전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궁중 정재의 무구, 무대 장치, 머리 장식 그리고 의상에 대한 연구는 이미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애드쉐드가 제시한 ‘무용의 구성 요소’ 이외의 부분인 ‘작품 제목, 음악 제목, 춤사위 명칭, 공간’과 궁중정재의 핵심인 ‘창사’를 중심으로, 각각의 요소에서 꽃의 등장 여부 및, 등장하는 꽃의 종류 그리고 등장 방식을 구체 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1
궁중 정재의 구성 요소
| 자넷 애드쉐드 무용 구성 요소 | 꽃을 통해 본 궁중 정재 구성 요소 |
|---|---|
| 움직임 | 구도(대형), 춤사위 |
| 무용수 | ⦁ |
| 시각적 무대 장치 | 무구(舞具), 무대 장치, 머리 장식, 의상 |
| 청각적 요소 | 창사, 음악 |
| 이 외 | 작품 제목, 춤사위 명칭, 음악 제목, 공간 |
가. 작품 제목
먼저 44개의 정재 종목 중에서, 제목에 직접적으로 ‘꽃’이 언급된 종목은 총 6개로 <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 <연화대무(蓮花臺舞)>, <연화무(蓮花 舞)>, <육화대(六花隊)>, <최화무(催花舞)>, <헌천화(獻天花)>이다. 이 여섯 작품의 공통점은 꽃이 작품의 중심 소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인전목단>은 조선 순조 때 창작된 향악정재로 서, ‘아름다운 사람이 목단을 꺾는다’라는 내용의 작품이다. 이때 제목에 언 급된 꽃은 ‘목단’으로, 목단은 모란꽃을 뜻한다. 이처럼 제목에 꽃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작품은 <연화대무>와 <연화무>이다. 두 작품 모두 ‘연 꽃’이 작품의 주제와 연관이 있다.
그러나, 위의 세 작품과 다르게 <육화대>, <최화무>, <헌천화>는 제목에 정확한 꽃의 종류가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목을 통해 작품의 주제 및 내용을 유추하는 것은 가능하다. 먼저 <육화대>는 제목을 해석하면, ‘여 섯 종류의 꽃의 무리’라는 뜻이다. 제목을 통해 정확한 꽃의 종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작품에 여섯 종류의 꽃이 등장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다음 으로 <최화무>는 ‘꽃이 피기를 재촉하는’ 내용의 작품이며, 마지막으로 <헌 천화> ‘천화(天花)를 바친다’라는 뜻으로 불교적 색채를 띤 작품이다.
이처럼 제목에 꽃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곧 작품을 이끌어가는 중심 소재 가 ‘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목에 꽃이 언급된 정재 종목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꽃이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작품의 ‘제목’을 통해 작품의 중심 소재와,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제목에 꽃이 언급된 6개의 정재 중 4개가 조선 순조 때 도입되거나 창작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작품의 제목에 직접 적으로 언급된 꽃은 2가지로, 목단(모란)과 연꽃이다. 특히 조선의 원예 서적 인 『양화소록』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꽃으로 분류되었던 ‘연꽃’은 2개의 작 품에서 제목으로 언급되었다.
나. 창사
꽃이 작품의 제목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창사에서 다양하게 언급되 기도 한다. 창사는 정재 연행 시 연행자가 움직임 사이에 읊는 ‘시(詩)’ 와 ‘가사(歌詞)’로, 작품의 주제 및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에 정재의 의미와 맥락 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위와 같이 창사에 ‘꽃’이 언급된 정재 종목은 44종 중 19종으로 <표 2>, <표 3>과 같다. 이 종목을 모두 다룰 수 없기에, 이 중 꽃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작품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꽃의 종류와 그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먼저 <가인전목단>은 ‘아름다운 사람이 목단(모란)을 꺾는다’라는 제목에 서 알 수 있듯이, 창사에서도 ‘모란’이 언급된다.
표 2
창사에 언급된 꽃
| 정재명 | 꽃 종류 |
|---|---|
| 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 | 모란 |
| 선유락(船遊樂) | 여뀌꽃 |
| 연백복지무(演百福之舞) | 백합꽃 |
| 연화대무(蓮花臺舞) | 연꽃 |
| 연화무(蓮花舞) | 연꽃 |
| 오양선(五羊仙) | 벽도화 |
| 육화대(六花隊) | 복숭아꽃, 살구꽃, 매화꽃, 해당화, 배꽃, 장미화, 산복숭아나무 꽃 |
| 최화무(催花舞) | 모란 |
| 향발무(響鈸舞) | 벽도화 |
표 3
창사에 꽃 관련 키워드가 언급된 정재 종목
| 정재 종목 |
|---|
| <고구려무(高句麗舞), <박접무(撲蝶舞)>, <보상무(寶相舞)>, <봉래의(鳳來儀)>, <수연장(壽延長)>, <첩승무(疊勝舞)>, <춘앵전(春鶯囀)>, <포구락(抛毬樂)>, <향령무(響鈴舞)>, <헌천화(獻天花)> |
萬朶先開照展紅 만 송이 꽃이 먼저 피어 궁전 붉게 비추고
姚黃魏紫妬玲瓏 요황(姚黃)과 위자(魏紫)가 영롱함 샘내누나
新翻玉笛淸平樂 새로 작곡한 청평악(淸平樂)을 옥적으로 불고
別樣仙香撲蝶風 특별한 선향이 나비 잡는 바람결에 풍기노라2)
위 창사의 2행에서 언급되고 있는 ‘요황(姚黃)과 위자(魏紫)’는 중국 고대 낙양의 요씨(姚氏)와 위씨(魏氏)의 집에 심은 황색과 자주색의 모란꽃을 의 미한다(허영일 외, 2005). 4행을 보면, 모란의 역할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은 중국 고대 음력 2월 15일, 처녀들이 밖으로 나가 나비를 잡으며 노는 ‘화조절(花朝節)’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허영일 외, 2005), 결국 위의 창사 는 ‘화조절’의 풍경을 상세히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모란이 언급된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최화무>이다. 창사에서 ‘모란’은 봄을 맞이한 금강(錦江)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 었다. 이렇듯 <가인전목단>과 <최화무>에 언급된 모란은, 조선 전기에는 유교 적 덕목을 내포한 사군자류 화훼의 대척점에 있었다(심성미, 2016). 이러한 이유로 조선 전기에는, 모란을 소재로 예술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렇다면 유교 사상이 팽배했던 조선에서, 속물의 상징이었던 ‘모란’이 어떻 게 궁중에서 연행된 <가인전목단>과 <최화무>에 등장하게 되었을까?
이는 작품의 창작 시기와 관련이 있다. 두 작품 모두 조선 후기인 ‘순조대’ 에 창작되었다. 조선 전기에 비해 조선 후기에는 화훼를 취미로 즐기는 문화 가 성행하였고, 유교적 덕목을 추구하는 것보다 부(富)의 성취를 좇아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부의 상징 인 ‘모란’의 인기가 급증하게 된다. 이를 통해 궁중 정재는 고착화되어있는 것이 아니며, 시대적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란과 같이 작품의 창사에 자주 언급되는 꽃이 있는데, 바로 ‘연꽃’이다. <연화대무>와 <연화무>에서 ‘연꽃’이 등장한다. 이 때 <연화대 무>에서는 연꽃이 가무의 주체인 연행자를 상징했지만, 그 연행자의 성별을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연화무>에서는 연꽃을 ‘삼천 명의 궁녀’에 비유하며, 명확하게 여성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연꽃은 두 작품의 창사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였다. 연꽃은 『양화 소록』의 저자 ‘강희안’이 단연 1등으로 뽑은 화훼 품목으로, 강인한 생명력 을 지닌 연꽃은 조선시대 회화, 시 등 여러 예술의 소재로 빈번하게 사용되 었으며 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당악 정재 <오양선(五羊仙)>과 향악 정재 <향발무(響鈸舞)>의 창사에는 ‘벽도화(碧桃花)’가 언급된다. 이 중 <향발무>는 작품 연행 과정에 창사가 포함되는, 1893년(고종 30) 『呈才舞圖笏記』 癸巳의 기록을 참고하였으 며, <오양선>과 계사년에 연행된 <향발무>에서는 동일한 창사가 사용되었다.
벽도화는 복숭아꽃을 의미하며, 이 중에서도 ‘흰색’의 복숭아꽃을 ‘벽도 화’라 칭한다. 복숭아꽃은 장수(長壽)와 벽사(辟邪)를 상징한다. 따라서 복숭 아꽃은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거나 국가의 안녕을 바라는 목적으로 연행 되는 궁중 정재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때 복숭아꽃뿐만 아니라 과실인 ‘복숭 아’도 주요 소재 및 소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꽃들이 등장하는데 <선유락(船遊樂)>에서는 ‘여뀌꽃’이, <연백복지무(演百 福之舞)>에서는 ‘백합꽃’이 언급된다.
마지막으로, <육화대(六花隊)>는 정재 종목 중 가장 많은 종류의 꽃이 등 장하는 작품이다. <육화대>는 중국에서 수입된 당악정재로, 조선시대에 재 연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 등장한 꽃은 ‘복숭아꽃, 살구꽃, 해당화, 배꽃, 장 미화, 산복숭아나무 꽃’으로 총 6가지가 등장한다. 또한 여섯 명의 여령(女 伶)이 연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각각 한 가지의 꽃을 맡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꽃을 여성에 빗대어 묘사한 창사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또한 6가지 꽃을 묘사하는 창사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바 로 ‘봄’이다. 위의 6가지 꽃은 모두 봄에 개화한다. 화창한 봄날에 여인들이 군왕께 재예를 바치는 내용으로 전개되는 <육화대>에서, 꽃은 봄이 왔음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자 봄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매개체이다. 이렇듯 ‘봄’ 과 ‘꽃’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정재의 창사에 등장한 꽃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꽃은 복숭아꽃으로, 총 3종류의 작품에서 언급되었다. 그 뒤를 이어 모란과 연꽃이 각각 2개의 작품에 등장하였으며, 이 외에도 백합꽃, 여뀌꽃, 살구꽃, 해당화, 배꽃, 장미화, 산복숭아나무 꽃이 정재의 창사에 쓰였다.
이는 구체적인 꽃의 종류가 언급된 사례만 적은 것일 뿐, 이 외에도 ‘꽃’과 연관된 단어가 정재에 언급된 사례는 많다. 이때 꽃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을 다채롭게 묘사 또는 표현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다. 음악 제목
정재에서 음악은 필수 요소이다. 조선 순조대에 이르러서는 가곡이 반주 악으로 활용되거나, ‘아명(雅名)’이 쓰이기도 하였다(임미선, 2011). 아명이 란 정재에 붙여진 임시 악곡명으로, 같은 형식의 음악이라도 작품의 주제나 연향의 목적에 따라 그와 관련된 새로운 아명을 붙이기도 한다. 따라서 반주 악의 제목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순조무자진작의궤』를 살펴보면 1828년 2월 12일 자경전 내진작례에서 ‘향당교주’는 총 39개의 아명으로 붙여져 연주되었다(박정련, 2011). 이 때 아명은 정재 연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이는 곧 아명을 붙이는 것이 궁중 정재의 레퍼토리를 다양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 다. 이러한 정재 악곡에 붙여진 ‘아명’에 꽃이 언급되기도 한다.
일례로 1893년(고종 30, 癸巳) 3월, 양로연(養老宴)에서 거행된 <박접무(撲 蝶舞)>에서는 <만정방(滿庭芳)>이라는 음악이 연주되었는데, <만정방>은 ‘뜰에 가득한 꽃’이라는 뜻이다. 이는 <박접무>의 반주음악인 ‘향당교주(響 唐交奏)’의 아명이다(허영일 외, 2005). 이뿐만 아니라 『무동각정재무도홀기』 에도 <박접무>에서 연주한 음악이 <만정방>이라 기록되어 있다.
<박접무>는 나비가 쌍쌍이 날아와 봄날의 풍경을 즐기는 내용의 작품으 로, ‘뜰에 가득한 꽃’이라는 음악의 주제와 <박접무>의 작품 내용에는 긴밀 한 관련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나비는 꽃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 따라 서 뜰에 가득 핀 꽃 주위에는 분명 나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비와 꽃은 그림이나 시가 등의 예술에서 함께 쓰이는 소재였다. 특히 조선 후기 나비 그림의 대가로 정평이 난, 문인 화가 남계우(南啓宇)는 대다수의 작품 에서 꽃과 나비를 함께 그렸다. 회화 분야에서는 ‘화접도(花蝶圖, 꽃과 나비 의 그림)’라는 명칭이 따로 있을 만큼, 꽃과 나비를 함께 그려 넣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특징이 정재에서도 드러나는데, <박접무>에서는 음악의 서 사와 작품의 내용을 연결하며 꽃과 나비의 관계를 묘사한다. 따라서 두 요소 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만 작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악곡명에 ‘꽃’이 등장하는 작품은 또 있는데, 바로 <춘광호(春 光好)>이다. <춘광호>는 1894년(고종 31, 甲午) 『외진연시무동각정재무홀기』 와 『무동각정재무도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시기에 연행된 <춘광호> 에서는 모두 <만화신지곡(萬花新之曲)>이 연주되었다. ‘온갖 꽃이 새롭다’ 라는 뜻을 지닌 <만화신지곡>은 <춘광호>의 반주악인 ‘향당교주’의 임시 아 명이다(허영일 외, 2005).
<박접무>에서 꽃과 나비가 함께 등장한다면, <춘광호>에서는 봄과 꽃이 긴밀한 관계로 등장한다. <춘광호>는 볕이 좋은 어느 봄날의 풍경을 묘사하 는 내용인데, 봄날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꽃’이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리고 꽃은 나비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또한 나비는 꽃가루를 옮겨 꽃의 번식을 돕는다. 이처럼 꽃과 나비 그리고 봄은 공생 관 계에 있다. 정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음악과 작품의 서사를 연결하며 드러 내고 있기에, 정재의 악곡명을 해석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위의 작품들을 보면 시대별로 연주되는 음악의 형식이나 구조에는 큰 변 화가 없지만, 같은 형식의 음악이더라도 연주되는 목적에 따라 음악의 주제 와 내용이 변화하기도 한다. 즉, <향당교주>라는 같은 음악이 연주되지만 붙여진 이름에 따라 작품의 연행 목적이 변화한다. 그리고 이것이 궁중 정재 연출을 다양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음악의 구조나 형식뿐만 아니라 음악에 내포된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정재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궁중 정재의 경우 무용 구성 요소를 분류하는 단계에서부터, 음악 의 제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꽃을 통해 입증된다. 정재 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각각의 목적과 의도가 있으며, 이는 곧 작품 전체의 연행 의도 및 내용과 연결이 된다. 따라서 음악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 다. 왜냐하면 정재에서 음악은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부수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종합예술인 궁중 정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음악의 제목’은 정재의 구성 요소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라. 춤사위
본 연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악학궤범』과 『정재무도홀기』는 정재 실연을 위해 작성된 춤 교본으로, 무용수들이 행하는 춤사위와 그 절차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춤사위로 작품이 구성되었는지 구체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꽃을 활용한 정재의 춤사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꽃을 무구로 활용하여 수행하는 춤사위이다. 본 연구에서는 꽃을 단순히 손 에 쥐고만 있는 춤사위는 언급하지 않고, 꽃이 움직임의 중심 소재로 사용이 되는 사례만 특정하여 살펴보았다.
〇 가인전목단
拍 박을 친다.
並弄花而舞 모두 꽃을 어르며 춤춘다.
拍 박을 친다.
並花枝剪執 모두 꽃가지를 꺾어들고⋯3)
〇 침향춘
拍 박을 친다.
弄花而舞 꽃을 어르며 춤춘다.
拍 박을 친다.
取花而舞 꽃을 꺾어 들고 춤춘다.4)
〇 연화무
拍 박을 친다.
各各取甁花而舞 각각 연화병에서 꽃을 뽑아들고 춤춘다.5)
위의 내용은 『정재무도홀기』의 <가인전목단>, <침향춘> 그리고 <연화 무> 무보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위의 세 작품의 춤사위는 주로 ‘꽃을 어르는 동작’과 ‘꽃을 꺾거나 뽑는 동작’으로 진행된다.
특히 <가인전목단>의 경우, 작품의 주제가 ‘꽃을 꺾는 것’이기 때문에 창 사에도 관련 구절이 언급되었으며 더 나아가 작품에 꽃을 꺾어 드는 춤사위 를 구성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시각화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 련된 소품도 쓰인 것이다. 이는 곧 궁중 정재의 세부 요소들이 매우 유기적 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꽃이 있다.
다음으로 위 작품들과 다른 방식으로 꽃을 활용한 작품이 있다. 바로 <학 무(鶴舞)>이다. <학무>는 조선 전기부터 전해지는 향악 정재로, 작품에 청학 (靑鶴)과 백학(白鶴)을 형상화한 무원 2인과 동녀 2인이 등장한다. <학무>에 서는 학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춤사위가 대거 등장한다. 학의 외형적 특징을 반영하여 연통을 ‘부리’로 쪼아 여는 움직임이 바로 이에 해 당이 된다. 이때 연통은 연꽃 모양의 통으로, 학이 연통을 쪼아 열면 그 속에 숨어있던 동녀 2인이 등장하고, 이에 놀란 학이 도망가며 작품이 그친다.
지금까지 꽃을 무구로 활용한 춤사위를 보았다면, 두 번째로 춤사위 명칭 에 ‘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총 4개의 춤사위 명칭에서 꽃이 언급되었는 데, 이는 모두 <춘앵전>에서 추어진 춤사위이다.
먼저 ‘화전태(化前態)’는 ‘꽃 앞에서 자태를 짓는다’라는 뜻으로, 두 손을 뿌려 뒤에 내려 여미고, 두 무릎을 굽히며 오른발과 왼발을 차례로 들었다가 내려놓는 춤사위이다. ‘전화지(轉花持)’는 ‘바람에 날리는 꽃잎을 잡는다’는 말로, 두 팔을 뒤로 벌리고 한 발씩 들며 솟아 뛰는 춤사위이다(허영일 외, 2005).
다음으로 ‘낙화유수(落花流水)’는 오른손을 위로 뿌리고 내려 여미고, 왼 손은 어깨 높이로 펴든 상태에서 왼쪽으로 회전하고, 다음 왼손을 위로 뿌리 고 내려 여미고,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펴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동작으로, ‘꽃잎이 흐르는 물에 떨어지는 것처럼 한다’라는 뜻이다(허영일 외, 2005). 마지막으로 ‘불화렴(拂花簾)’은 ‘꽃무늬가 그려진 발을 스친다’는 뜻으로, 두 소매를 뿌려 한쪽 소매는 어깨 옆으로 펼쳐 내리고, 다른 한쪽 소매는 머리 뒤로 내리는 춤사위이다(허영일 외, 2005).
일반적으로 정재에 쓰이는 춤사위 용어는 정형화되어 있다. 이는 곧 각각 의 정재 종목에서 수행되는 춤사위가 유사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에 효명 세자가 지은 <춘앵전>에서는 이제껏 쓰이지 않았던, 새로운 춤사위 들이 여럿 등장하고 있으며, 춤사위 명칭과 의미에서 꽃이 여러 차례 활용되 었다. 또한 <춘앵전>은 한 명의 연행자가 춤을 추는데, 이는 궁중 정재에서 보기 드문 독무 작품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작품 창작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을 추측할 수 있다.
마. 공간
꽃은 단순히 무대에서 소품이나 장치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꽃은 궁 중 정재가 연행되는 장소의 곳곳에서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궁중 정재 는 엄격한 법도가 적용되는 ‘궁중 연향(宴享)’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재가 연 행되는 장소는 곧 궁중 연향이 거행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즉, 궁중 연향 공 간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또 왕과 왕비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 꽃을 여러 방식 으로 활용하였다(김혜자, 2008).
이러한 연행 공간에 대해서는 『홀기』에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으며, 각종 『의궤』에서 상세하게 기록 또는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 두 문헌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홀기』는 거행될 의식이나, 궁중 연향의 절차를 미리 정하여 글로 정리해둔 것으로, 일종의 교본 또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정재무도홀기』에는 정재 연행 방식이나 절차, 그리고 사용되는 음악과 창사, 춤사위 등이 상세하기 기록되어 있어, 연행자의 실기 교육을 위해 사용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재 연행 당시의 현장성을 담아내기 어려우며, 특히 공연 ‘공간’에 대한 언급은 배제되어 있다.
반면에 『의궤』는 의식이나 연향이 거행된 후에 당시의 상황과 현장에 대 한 여러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보고서 형태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에 정재가 연행되었던 공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의궤』에 수록된 ‘진연도(進宴圖)’나 ‘정재도(呈才 圖)’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의궤』에는 다양한 그림 기록도 삽입되 어 있기 때문에, 당시 연향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궤』의 기록이나, 수록된 그림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앞서 궁중 정재의 연행자들이 무구나 무대 장치로 조화(造花)를 사용하였 듯, 연행 장소에 등장하는 꽃도 모두 조화 혹은 가화(假花)인데, 의궤에서는 이를 ‘채화(綵花)’라 기록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연행 공간에서 채화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먼저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를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 화준에 꽃을 꽂아 장식하는데, 이를 ‘준화(樽花)’라고 한다. 다음으로 왕, 그리고 연행에 참여한 군신들이 머리에 채화를 꽂기도 하였다. 또한 연행에 참여한 왕과 관료들의 상차림에서도 꽃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상화(床花)라고 한다. 왕의 상인 어상(御床)에는 음식을 높이 쌓아 각 음식마다 상화를 꽂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에 초대된 사람들의 상에도 꽃병이 올라가 있다. 이때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계층과 의식의 성격에 따라 꽃의 종류 및 수량 이 다르게 사용하였다. 즉, 지위가 높을수록 다양하고 풍성한 꽃이 상에 올랐 다는 것이다(김혜자, 2008).
상화(床花)는 대수파련은 밀랍으로 연꽃잎을 만들고, 월계화 ․ 홍도화 ․ 벽 도화 및 대내에서 내린 당가화 등을 사이에 꽂고, 선동(仙童) 10인이 받들 고 있는 금잔과 은잔 위에 남극노인(南極老人)이 ‘강구연월수복다남(康衢 煙月壽福多男)’이라고 금물로 쓴 8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을 찬안(饌案) 가 운데 꽂는다. 또 중수파련과 소수파련을 좌우에 꽂고, 홍도화 ․ 절화 ․ 별건 화 ․ 간화(間花) ․ 목단화를 대소 음식 그릇 및 외선상(外宣床) 이하와 사찬 상(賜饌床) 이하에 나누어 꽂는다(고종 임인년 『進宴儀軌』 제2권).
위 기록을 통해 상화로 월계화, 홍도화, 벽도화, 당가화, 목단화 등이 쓰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꽃은 연향의 공간을 화려하게 꾸미거나, 왕에게 예를 갖추거나 또는 신분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와 같이 꽃이 사용되는 공간은 단순히 춤을 진행하는 ‘무대’에만 한정되 어 있지 않다. 즉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무용 작품 분석에서, 무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객석의 공간 에서도 꽃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재의 공연 공간은 프로시니엄 공연장과 달리 객석과 무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재에서의 공간은 무대뿐만 아니라 객석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꽃을 통해 정재에서의 공간 그리고 무대에 대한 개념을 재인 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기존의 ‘무대 공간’에 초점이 맞추어진 무용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궁중 정재 연구에서 연향이 진행되는 ‘공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며, 따라서 ‘공간’ 역시 궁중 정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간주하여 세밀하게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Ⅲ. 결론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자연과 가까이 사는 삶을 추구하였으며, 특히 꽃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보여왔다. 따라서 꽃은 조선시대 예술의 분야에서도 그 소재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정조대 ~ 고종대의 『의궤』에 기록된 정 재 44종 중, 43종에서 꽃이 등장하지만 궁중 정재 속 ‘꽃’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Dance Analysis : Theory and practice』에서 자넷 애드쉐드가 제시 한 무용의 구성 요소 분류법을 토대로 정재에서 ‘꽃’이 등장하는 방식을 파 악하다 보니, 애드쉐드가 제시한 ‘무용의 구성 요소’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꽃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정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작품 제목, 음악 제목, 춤사위 명칭, 공간’과 궁중정재 의 핵심인 ‘창사’를 중심으로, 각각의 요소에서 꽃의 등장 여부 및, 등장하는 꽃의 종류 그리고 등장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작품의 제목에 꽃이 언급된다. 꽃이 제목에 언급된 여섯 작품에서는 꽃이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한다. 이를 통해 작품의 제목 역시 궁중 정재의 중요한 분석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재의 창사에서도 꽃이 언급된 다. 창사는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를 드러내는, 궁중정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가장 많이 언급된 꽃은 복숭아꽃이고, 그 뒤를 이어 모란꽃과 연 꽃이 각각 2개의 작품에 등장하였다.
음악의 제목에도 역시 꽃이 언급되었다. 정재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각각 의 의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이 곧 작품의 전체 내용과 연행 목적을 시 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므 로 무용의 음악의 제목 역시 분석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움직임에서는 어떠한가? 정재의 춤사위에서도 꽃이 활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춘앵전>에 언급된 춤사위 명칭은 기존의 정형화된 춤사위 용어에서 벗어나 ‘꽃’ 개념을 적극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꽃은 무 대 이외의 ‘공간’에서도 활용된다. 즉, 궁중 연향이 거행되는 장소 곳곳에서 (준화, 화관, 상화 등)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재의 연행 공간 은 객석과 무대가 명확히 분리된 형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재에서의 공간과 무대에 대한 개념을 꽃을 통해 재인식 및 확장하 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꽃은 궁중 정재의 다양한 요소에서 등장한다. 궁중 정재의 경우 歌·舞·樂·詩가 종합된 총체예술이기에 각각의 요소를 독립적으로 살펴볼 뿐 만 아니라, 이들 간의 유기적 관계에도 주목하여 해석 및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궁중 정재의 특징이며, 본 연구에서는 꽃을 통해 정재의 종합예 술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재 연구에서 잘 다뤄지 지 않았던 요소들을 꽃을 통해 조명하며 정재의 개념을 새롭게 환기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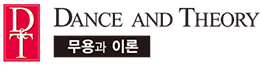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